
"영인원탁회의 전원위원회는 "버마"를 인도로부터 분리하자는 원칙을 가결하얐다."(1930년 12월 6일 동아일보)
미얀마와 한국은 어떤 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 이 칼럼의 첫머리에서 미얀마를 한자어로 ‘면전(緬甸)’이라고 쓴다고 소개한 적이 있고, 1989년 이전까지의 국가공식 명칭은 ‘버마’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한국의 미디어에 이 버마라는 표기가 등장한 시점은 동아일보가 1930년 런던발 기사로 “緬甸分離可決(면전분리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것이 처음이다. 오늘 글은 '면전'이라는 표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과 한국의 교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버마라는 명칭은 이라와디강 평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배종족을 가르키는 것으로 19세기부터 1930년 그 이전까지는 영국-인도제국의 한 지방정부로만 구분되었을 뿐이다.
그것이 버마의 민족의식 확대로 인해 인도와 구분된 지역으로의 정체성을 요구하고, 다시 1937년부터는 버마의 대표(의회)를 구성해 반(半)자율적인 정치체제로 대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는 어찌보면 버마엘리트가 독립을 포기한 행위로 볼 수가 있으나 1895년부터 사실상 영국의 통치가 아닌 인도에 흡수합병된 측면이 있어, 버마 민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성취라고 볼 수 있다.
그럼 1930년 이전에는 한국은 미얀마를 어떻게 불렸을까. 미얀마의 마지막 꼰바웅 왕조(1752~1885)이고 동남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한 왕조이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조선왕조와는 왕래기록이 없어 꼰바웅이란 명칭에 대한 기록은 없어 보인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바간왕조(849-1297)로 몽골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찬란한 불교문화로 꽃을 피웠지만 이 시대 역시 우리와 교류 기록이 없긴 마찬가지다. 당시 이 바간왕조를 지칭하는 민족을 주변에서 '미르마(mirma)'라고 불렀는데, 이를 중국의 역사서는 음역해 ‘면전’이라고 기록했고 이 이름으로 영국에 의한 버마라는 명칭이 확립하기 전까진 1000년 가까이 면전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게 된다.
1. 조선왕조 실록에 담긴 ‘면전’의 기록
"면전국(緬甸國)은 운남(雲南) 밖 먼 남쪽에 있어 길이 매우 멉니다"---(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8월 12일 신축 2번째기사)
역사적으로 중국의 작명법은 발음과 뜻을 모두 잡고자 노력한다. ‘면전’ 역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緬(면)은 ‘가는 실’을 뜻하고 甸(전)은 왕성주위의 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윈난의 고원지대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 보았을 때, 거대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아주 멀고 먼 ‘가느다란 실’같은 지평선이 펼쳐져 있고, 사방천지에 불탑(파고다)가 세워진, 머나먼 왕국, 혹은 곡창지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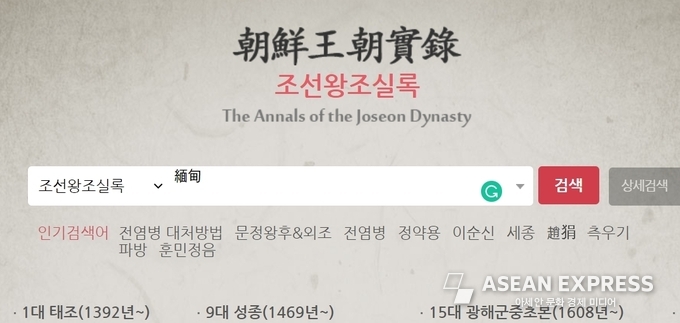

그런데 왜 하필 한국식으로는 ‘면’, 중국식으로는 ‘미옌’을 썼을까? 그것은 현재의 국호인 미얀마와 관계된 것으로, 학자들은 10세기 이전 버마족의 어원이 된 표현을 ‘므란마’ 정도로 추측한다. 이 표현이 므->브 로 교체가 되면서 먄마->바마->버마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므’라는 발음에 기초해 ‘면전’이라는 국호가 중국에서 정착했고 이를 한국에서도 한동안 ‘면전’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들도 1930년대 이후 상당기간을 ‘면전’과 ‘버마’를 섞어쓰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면전’의 기록은 총 16회로, 대개 중국에서 사신으로 함께 자리했다거나 혹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한 특정 사건에 집중된다. 바로 명청교체기 명(明)나라 마지막 황실의 비극적인 최후와 관련된 내용이다.
임진왜란에서 알수 있듯, 명나라(1368-1644)는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왕조에게는 거대한 은인이자 중화사상에 찌든 조선사대부들에게는 문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존재다. 그런데 갑자기 만주족이 중원을 휩쓸고 명황실이 멸하고 이른바 망명왕조인 남명(南明)이 세워져 광동과 운남까지 쫓겨가게 된다.
결국 남명 최후의 황제 ‘영력(永曆)제’는 미얀마의 국경너머로 도망하게 되었지만, 1662년 청나라의 장군 오삼계 붙잡혀 죽고 만다. 이렇게 미얀마는 명제국의 비극의 무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일종의 교훈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다.
"손가망은 청나라에 항복하자, 영력이 면전국(緬甸國)으 로 도망갔다."----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개수실록] 11년 윤2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2. 국민당 군대 최후의 탈출구, 그리고 쿤사
잠깐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얘기로 옆길로 새어 보자.
명나라의 최후로도 알 수 있듯 미얀마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중국대륙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Exit)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사방팔방으로 뻗은 대국이기 때문에 중원싸움에 진 패자의 행로가 다양할 것 같지만, 그 방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동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고, 서쪽은 사막으로, 북쪽은 원래 유목민족의 고향이다보니 활로는 사천이나 운남성 등의 서남쪽의 깊은 산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인도로 가는 길은 티벳고원에 막혀있으니 최후의 선택은 미얀마로 가는 길만이 남게 되는 식이다.
남명의 역사는 300년을 뛰어 넘어 1949년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군의 패배에서도 확인된다. 1-2차 국공내전을 통해 중국공산당을 거의 궤멸직전까지 몰고 갔던 국민당의 장개석은 이후 와신상담에 성공한 공산당군에 밀려 동으로는 대만으로 쫓겨가고 서로는 충칭에 고립되기에 이른다. 충칭과 버마 국경까지는 불과 700~800km 남짓에 불과해 사실상 .
1949년 12월 10일, 장개석이 충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이완으로 피신하자 남아있던 수십만의 국민당군대는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고 결국 무장한 5만이 넘는 군대가 공산당의 공격을 피해 버마 국경을 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후 이들 국민당 잔당은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상당기간 세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생존을 위해 양귀비 등 마약 재배까지 나서며 지역의 불안요소가 되기도 한다.
1960-1980년대 버마, 태국, 라오스의 국경지대에서 마약왕으로 불렸던 '쿤사'라는 인물을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이런 버마 북부의 독립적 무장세력이 다름아닌 국민당 군대의 잔당과 그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양귀비를 중심으로 한 국제 마약시장의 큰 손으로 활약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미얀마나 태국의 지방정부에 흡수가 된다.

3. 면전에서 버마로 다시 미얀마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정세가 중국에서 서구로 급속하게 변화한 20세기 초반, 자연스럽게 면전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버마라는 이름이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버마'라는 국호가 익숙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제사회는 버마라는 이름 대신 '미얀마'를 정식 국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88년 등장한 미얀마의 신군부가 자신들의 새로움과 개혁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1989년 '버마'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얀마'라는 새로운 국호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집권한 미얀마의 신군부는 1988년에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총칼로 진압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당시 국제사회는 신군부 세력을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이후 수십년간 경제적 제재를 가하며 민주화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
때문에 국호는 바뀌었지만 대다수의 국제사회가 한 동안 미얀마 대신 '버마'라고 부르는 혼선이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2016년, 아웅산 수찌 여사가 사실상의 국가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이런 혼선은 조금 수그러든 모양새가 됐다.

수찌 여사의 해법은 "어느 이름으로 부르든지 상관이 없다"에 가까웠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버마와 미얀마는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얀마라는 공식적인 국가이름을 불러줘도 상관이 없을 시점이 된 것이다. (계속)
정호재는?
기자 출신으로 현재 싱가포르와 미얀마에서 아시아학을 공부하며 현지 시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태국의 탁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캄보디아의 삼랑시 등 동남아 대표 정치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책 등을 번역했다.









